이 글은 2000년에『한국 현대시 비판』(월인)에 실린 것입니다.
감옥에서 들은 가을바람 소리
-한용운의 옥중 한시 아홉 수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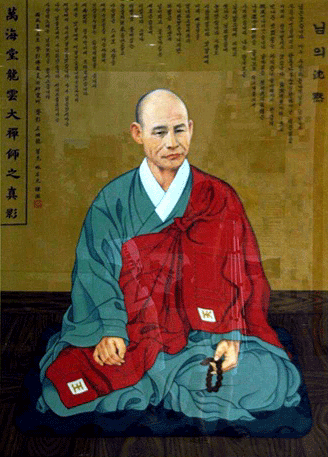
만해 한용운 시인이 1926년에 자비로 펴낸 시집 『님의 침묵』이 없었더라면 1920년대의 우리 문단은,
- 아니 한국 시문학사는 얼마나 공허해졌을까.
- 민족대표 33인 중 한용운이 없었더라면 민족자결을 내세운 3․1운동의 정신이 과연
- 제대로 발아하고 개화할 수 있었을까.
- 한용운 선사가 없었더라면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한국 불교계는 어느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을까.
- 상상만 해도 ‘그래서는 안 된다’고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.
- 만해는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시인 혹은 민족정신의 사표로 일컬어질 수 있으며,
- 독립투사나 종교지도자, 아니 조직운동가나 혁명가로 불리어도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닐 것이다.
1944년에 돌아가셨으니 선생이 가신 지도 어언 56년이 되었다.
- 시인 한용운의 업적을 기려 만해문학상이 제정되어 다년간 시상을 해오고 있고,
- 해마다 여름이 되면 백담사에서 만해시인학교가 열리고 있다.
- 선생의 사상과 문학을 연구한 글을 모은 『만해새얼』이라는 간행물도 나오고 있다.
- 만해는 예순여섯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생애를 사는 동안 시는 물론 장편소설․단편소설․시조․수필․한시 등
- 많은 문학작품과 그에 못지않게 많은 논문․논설․雜俎(각종 일을 써 모은 기록)를 남겼다.
- 논저 『朝鮮佛敎維新論』과 편저 『佛敎大典』『精選講義 菜根譚』,
- 그리고 선언서 「朝鮮獨立의 書」를 작품 연보에서 뺄 수는 없다.
만해가 남긴 한시는 1,300여 수에 이른다.
- 그간 몇 사람 국문학자가 만해의 한시를 연구한 바 있는데, 김종균의 「한용운의 한시와 시조」
- (『어문연구』제21호, 1979), 이병주의 「만해 선사의 한시와 그 특성」(『동국대 한국문학 학술회의』, 1980),
- 송명희의 「한용운의 한시론」(『한용운연구』, 새문사, 1982)이 그것이다.
- 이 가운데 만해가 옥중에서 쓴 한시를 중심으로 해서 쓴 논문은 없다.
그간 만해의 문학세계와 불교사상을 연구한 글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왔고,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.
- 100편이 넘는 한용운론 가운데 옥중에서 쓴 한시가 전혀 논의된 적이 없는
- 이 땅의 문학연구와 문학사는 나를 안타깝게 한다.
- 만해의 한시에 깃들어 있는 시정신을 탐색하여 고전적 가치를 논해보는 것이
- 이 글을 쓰는 작은 목적이다.
만해는 3.1운동의 주동자로서 가회동에 있는 손병희의 집을 수차례 방문하여
- 그로 하여금 민족대표 발기인의 서두에 서명하게 한다.
- 선생은 또 최남선이 작성한 「독립선언서」를 수정하고 여기에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「공약삼장」을 첨가한다.
- 거사일인 3월 1일 경성 명월관 지점에서 33인을 대표하여 독립선언 연설을 하고
- 곧바로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 감금된 만해는 해를 넘겨 1920년 8월 9일에야
- 경성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3년형을 선고받는다.
- 3년의 옥살이를 마치고 1922년에 출감했으니 만해의 옥중시는 전부
- 『님의 침묵』을 내기 전에 썼던 작품임에 틀림없다.
- 투옥되고 재판을 받고 석방되는 과정에서 만해에 관한 일화가 몇 개 전해지고 있다.
왜경에 끌려갈 때 그는 이른바 ‘옥중투쟁 삼대원칙’을 제시했으니
- ①변호사를 대지 말 것,
- ②私食을 취하지 말 것,
- ③보석을 신청하지 말 것 등이 그것이다.
법정의 심문에서 “조선인이 조선의 독립운동을 하는데 왜 일인의 재판을 받느냐”고 대답을 거부,
- 그 대신에 쓴 것이 명논설 「三․一 獨立宣言理由書」였다.
같이 수감된 독립운동의 동료들이 극형을 받으리란 소식을 듣고 안색이 파래지자
- “독립만세를 부르고도 살아날 생각들을 했단 말이야?”고 외치며 옆에 있던 변기를 던지기도 했다.
- 그들이 출옥할 때 얼싸안고 환호, 위로하는 영접 인사들에게 만해는 침을 뱉으며 일갈했다.
“더러운 자식들, 오죽 못났으면 영접을 해?
- 너희들은 왜 영접을 받지 못하니!”
ㅡ김병익, 『韓國 文壇史』(일지사, 1973)에서
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생애 단 한 번도 훼절한 적이 없이 일제의 강압 통치에
- 불굴의 기개로 맞서 싸웠던 만해로서는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말이요 행동이다.
1879년생이므로 만해는 마흔한 살부터 마흔세 살까지 옥살이를 하였다.
- 만해가 투옥되어 있던 시기에 동인지 『폐허』와 『백조』가 창간되었고,
- 바로 전에 나온 『창조』도 계속 간행되어
- 우리 문단에서는 3.1운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근대시가 등장하고 활발히 발표되기 시작한다.
- 하지만 이 시기에 작품 활동을 한 남궁벽․오상순․황석우․변영로(이상『폐허』동인)와
- 홍사용․박종화․박영희․이상화(이상『백조』동인)의 작품을 보면
- 거의 예외 없이 비탄과 절망, 感傷과 悔恨의 정조에 사로잡혀 있다.
『폐허』창간호에서 오상순이 한
- “우리 조선은 황량한 폐허의 조선이요, 우리 시대는 비통한 번민의 시대이다”라는 말은
- 그 무렵 대다수 지식인과 문학인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었다.
- 당시 시인들의 작품을 읽어보면 시인의 몸과 마음이 모두
- ‘밀실’과 ‘동굴’과 ‘관’ 속에 갇혀 있었음을 알 수 있다.
- 시대는 ‘말세’요, 계절은 ‘가을’이 아니면 ‘겨울’이었고,
- 시간은 늘 ‘밤’이었다.
- 같은 시기 ‘감옥’에 갇혀 있던 만해는 그러나 한겨울의 추위에도
- 정신의 칼을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.
- 그 시기에 만해가 쓴 시가 한글로 쓴 것이 아니라고 하여
- 문학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될 일이다.
- 만해가 옥중에서 쓴 한시를 서툰 솜씨로 번역하여 본다.
獄中吟(옥중에서 읊는다)
隴山鸚鵡能言語 농산의 앵무새는 언변도 좋네그려
愧我不及彼鳥多 내 그 새에 못 미치는 걸 많이 부끄러워했지
雄辯銀兮沈黙金 웅변은 은이라지만 침묵은 금
此金買盡自由花 이 금이라야 자유의 꽃 다 살 수 있네
이 시에 나오는 ‘농산’은 중국 섬서성 농현 서북쪽에 있는 산 이름이다.
- ‘농산의 앵무새’가 어떤 고사에 나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
- 사람이 하는 말을 흉내 잘 내기로 이름난 새였던 모양이다.
- 만해가 과거에는 그 새의 언변에 못 미치는 것을 많이 부끄러워했지만
- 옥에 갇혀 침묵이 금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고는 자경록을 쓰듯이 이 시를 쓴 것이리라.
- 3․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계의 대표였으니 일제가 만해를 회유․포섭하기 위해
-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 것인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.
- 옥중에서 쓴 한시였으니 옥리의 눈에 띄어 고초를 겪을 수도 있었을 텐데
- 만해는 이곳에서 침묵을 지켜야 종국에는 자유의 꽃을
- 몽땅 사게 될 것이라고 자신을 경계했던 것이다.
見櫻花有感―獄中作(벚꽃을 보고 느낌이 일어)
昨冬雪如花 지난 겨울 꽃 같던 눈
今春花如雪 올 봄 눈 같은 꽃
雪花共非眞 눈도 꽃도 참이 아닌 점에서는 같은 것을
如何心欲裂 어찌하여 마음의 욕구 이리 찢어지는지
만해는 자신의 눈을 현혹했던 꽃 같았던 눈과 눈 같았던 꽃을 참이 아닌 점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한다.
- 눈은 산천을 백색으로 수놓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녹아버리고,
- 일본의 국화 벚꽃은 피었다가 금방 난분분 흩날리며 떨어진다.
- 감옥 창살 밖으로 떨어지는 벚꽃을 보며 생각하니 이 나라는 완전히 일본인의 식민지가 되어 있고
- 해방이 될 희망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다.
- 만해는 어느 봄날 ‘心欲裂’이라며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
- 이 시에다 토로해보았던 것이리라.
寄學生―獄中作(학생에게 부친다)
瓦全生爲恥 헛된 삶 이어가며 부끄러워하느니
玉碎死亦佳 충절 위해 깨끗이 죽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가
滿天斬荊棘 하늘 가득 가시 자르는 고통으로
長嘯月明多 길게 부르짖지만 저 달은 많이 밝다
세 번째 번역해본 시는 제목이 ‘寄學生―獄中作’이다.
- 제목으로 보아 면회를 온 학승에게 전해준 시가 아닌가 여겨진다.
- ‘瓦全’과 ‘玉碎’는 정반대의 뜻이다.
- 아무 보람 없이 헛된 삶을 이어가는 ‘瓦全’과 명예와 충절을 지켜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는
- ‘玉碎’를 시에다 써 감옥 바깥으로 전하는 일 자체가 큰 모험이었을 것이다.
- 목숨을 보전코자 기개를 굽히고 사느니 차라리 깨끗이 죽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
- 옥중에서 시로 썼으니 만해의 용기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.
- “하늘 가득 가시 자르는 고통으로/ 길게 부르짖지만 저 달은 많이 밝다”라는
- 뒤의 두 행이 제대로 번역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,
- 만해가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면 언젠가 이 옥문을 나서게 될 것이라고 달에 빗대어
- 다짐하고 있음을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다.
雪夜(눈 오는 밤)
四山圍獄雪如海 감옥 둘레 사방으로 산뿐인데 해일처럼 눈은 오고
衾寒如鐵夢如灰 무쇠처럼 찬 이불 속에서 재가 되는 꿈을 꾸네
鐵窓猶有鎖不得 철창의 쇠사슬 풀릴 기미 보이지 않는데
夜聞鐵聲何處來 심야에 어디서 쇳소리는 자꾸 들려오는지
충남 홍성의 생가
눈 내리는 밤의 감회를 읊조린 시이다.
- “무쇠처럼 찬 이불 속”이니 그 겨울 만해의 옥고는 인간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를 정도였나 보다.
- “재가 되는 꿈”(아니면 재 같은 꿈?)은 자신이 죽는 장면을 꿈에서 보았기에 표현하게 되었을 것이다.
- 하지만 철창의 쇠창살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눈은 해일처럼 엄청나게 내리고 있다.
- 심야에 들려오는 쇳소리가 다른 방 옥문을 여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
- 아무튼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 모두가 만해를 비감한 심사에 휩싸이게 해
- 이런 시를 썼을 것이다.
秋懷(가을 감회)
十年報國劒全空 십년 세월 보국하다 칼집 완전히 비고
只許一身在獄中 한 몸 다만 옥중에 있는 것이 허용되었네
捷使不來虫語急 이겼다는 기별 오지 않는데 벌레는 울어대고
數莖白髮又秋風 또다시 부는 가을바람에 늘어나는 백발이여
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행이 아니다.
- 옥에서야 머리를 기를 수밖에 없었을 테지만 사십대 초반의 나이였으니 백발 운운은 과장법을 동원한 것일 듯.
- 그런데 “捷使不來”라는 대목이 있다.
- ‘捷報’는 싸움에 이겼다는 보고나 소식이다.
- 만해는 고통스런 영어의 나날을 살면서도 ‘捷使’가 오지 않음을 못내 애통해하고 있었다.
- 죽음과 절망의 그림자에 휩싸여, 탄식과 눈물로 시를 수놓던 옥문 바깥의 시인들과는
- 사고의 기본 틀이 이토록 달랐던 것이다.
贈別(이별 노래)
天下逢未易 하늘 아래 만나기 쉽지 않은데
獄中別亦奇 옥중에서 하는 이별 기이할 밖에
舊盟猶未冷 옛 맹세 아직 안 식었으니
莫負黃花期 국화 피면 다시금 부담 없이 보세
먼저 출옥하는 사람에게 정표로 써서 건네준 시이다.
- 옥중에서 하는 이별이라 기이하다고 한 뒤 만해는 “舊盟猶未冷”이라고 썼다.
-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했던 맹세가 아직 안 식었으니 국화 만발한 바깥세상에서 다시 만나되,
- 누가 먼저 나가고 누가 늦게 나갔는가에 대한 부담감을 피차 갖지 말고 만나자고
- 상대방을 오히려 위로한다.
-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마지막 행이지만 나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.
砧聲(다듬이 소리)
何處砧聲至 어디서 나는 다듬이 소리인가
滿獄自生寒 감옥 속을 냉기로 가득 채우네
莫道天衣煖 천자의 옷 따뜻하다 하나 도가 아니다
孰如徹骨寒 뼛속까지 냉기가 스며드는 것을
감옥에까지 들려온 다듬이 소리를 소재로 해서 쓴 시이다.
- ‘天衣’는 天子의 옷, 仙人의 옷, 飛天(신선이나 선녀)의 옷 중 어느 것을 택해도 무방하겠지만
- 일제치하라는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여 “천자의 옷”으로 해석해보았다.
- 즉, 천자는 천황의 다른 말로 쓴 듯하다.
- 천의가 제아무리 따뜻하다고 한들 그것은 도가 아니며,
- 나는 지금 뼛속까지 냉기를 느끼고 있을 뿐이라며
- 일제의 침탈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다.
마포 형무소
咏燈影(등불 그림자를 보며)
夜冷窓如水 추운 밤 창에 물이 어리면
臥看第二燈 두 개의 등불 누워서 보게 되지
雙光不到處 두 불빛 못 미치는 이 자리에 있으니
依舊愧禪僧 선승인 것 못내 부끄럽기만 하다
만해는 이 시에서 천정에 매달려 있는 등과, 물 어린 창이 반사하고 있는 두 개의 등을 제시하고 있다.
- 그런데 자신이 누워 있는 자리에는 두 개의 불빛이 다 못 미치고 있다.
-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감옥이라는 공간을 생각해보면
- 이 시를 쓴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.
- 선승이므로 구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거늘 지금 자신은 완전히 다른 세계,
- 곧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인 것이다. 그것을 애통해한 시가 바로 「咏燈影」이다.
咏雁二首―獄中作(기러기 노래 두 수)
一雁秋聲遠 가을 기러기 한 마리 멀리서 울고
數星夜色多 밤에 헤아리는 별 색도 다양해
燈深猶未宿 등불 짙어지니 잠도 오지 않는데
獄吏問歸家 옥리는 집에 가고 싶지 않는가 묻는다
天涯一雁叫 하늘 끝 기러기 한 마리 울며 지나가니
滿獄秋聲長 감옥에도 가득히 가을 바람소리 뻗치는구나
道破蘆月外 갈대가 쓰러지는 길 저 밖의 달이여
有何圓舌椎 어찌하여 너는 둥근 쇠몽치 혀를 내미는 거냐
문학적 향기를 가장 짙게 풍기는 작품이다.
- 앞쪽 시에서 만해는 가을밤의 스산한 심사를 절묘하게 노래하는데,
- 그것으로는 무언가 미진했던 모양이다.
- 뒤쪽 시의 마지막 두 행에 주제가 담겨 있는 듯한데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.
- 달에 빗대어 만해는 ‘圓舌椎’라고 표현하였고, 나는 그것을 “둥근 쇠몽치 혀”로 해석하였다.
- 달은 차면 기우는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만해는 말을 아끼자는 결심을 해본 것이 아닐까.
- 달이 내 신세를 알고 혀를 차고 있다고 생각해본 것일 수도 있다.
- 달은 밤길을 밝혀주므로 길 잃은 자를 안내하는 이로 빗대어본 것일지도 모른다.
- 기러기와 갈대는 부화뇌동하는 존재로, 달을 은인자중하는 존재로 그려본 것일까.
-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다.
- 아무튼 만해는 자연 상관물 몇 가지를 시의 소재로 끌어들여 깊어가는 가을밤에
- 자신의 처연한 심사를 읊어보았던 것이다.
옥중에서 쓴 것이 확실한 이들 작품 외에도 수많은 한시가 새로운 해석과 연구를 기다리고 있다.
- 다음과 같은 시를 보자.
黃梅泉
就義從客永報國 의로운 그대 나라 위해 영면했으나
一瞋萬古刦花新 눈 부릅떠 억겁 세월 새 꽃으로 피어나리
莫留不盡泉坮恨 황매천 엄청난 한을 다하지 말고 남겨둡시다
大慰苦忠自有人 사람됨을 스스로 괴로워했던 것 크게 위로하고프니
매천 황현은 한일합병 조약 체결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
- 「절명시」를 남기고 자결한 한말의 문장가요 역사가이다.
- 만해는 황현의 엄청난 한을 늘 생각하며 시를 썼음을 알 수 있다.
- 다수 문인이 비탄에 잠겨 슬픔과 좌절을 노래하고 있을 때 만해는 흔들리지 않는 자존심으로
- 자신을 성찰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시가 바로 「黃梅泉」이다.
만해의 민족운동은 석방 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된다.
- 일제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물산장려운동과 신간회 결성 운동에 참여하였고,
- 청년 法侶 비밀결사인 卍黨의 당수로 추대되었으며, 신채호의 묘비를 건립하였다.
- 창씨개명 반대운동과 조선인 학병 출정 반대운동을 목숨을 내놓고 전개하였고,
- 조선총독부와 마주보게 된다고 성북동에 집을 지을 때 북향으로 지었다.
- 일제가 창씨개명과 징병을 강요하면서 불교계를 대표하는 만해의 찬성을 얻고자 회유책을 쓴 적이 있었다.
- 성북동 일대의 넓은 국유지를 한용운의 이름으로 불하하려 하자 만해는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하였다.
친일의 족적을 한 발자국도 남기지 않은 진정한 지식인 한용운이
- 옥중에서 쓴 한시 아홉 수가 오늘 내 가슴을 치는 것은
- 내 나이가 투옥 당시 만해의 나이와 똑같은 마흔하나이기 때문일까.
- 나는 만해가 쓴 한시 중 이상 몇 편을
- 우리 문학의 빛나는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.
- (2000) ................. 펌
[국악명상음악]- "백년심"
'***아름다운글,시*** > 漢詩(한시)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‘취하신 님께(증취객·贈醉客) (0) | 2010.03.20 |
|---|---|
| 황진이 시조5편 (0) | 2010.03.20 |
| 春望詞 四首(춘망사 4수) (0) | 2010.03.19 |
| 待郎君(대랑군/ 낭군을 기다리며) 작가: 雪竹(설죽) (0) | 2010.03.19 |
| 행복해진다는 것 / 헤르만 헷세 (0) | 2010.03.19 |




